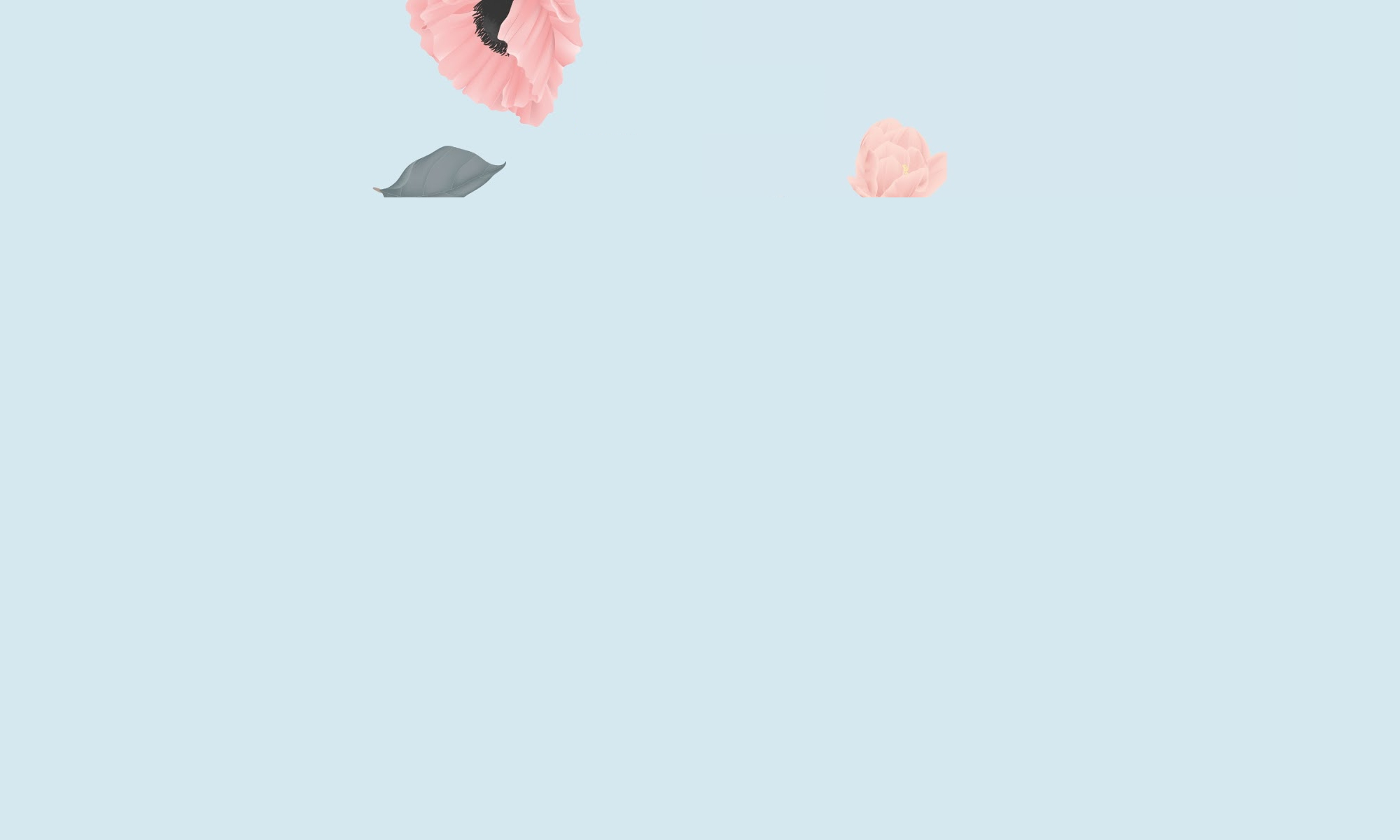순천과 전주에서 한여름 밤의 꿈과 같은 연주여행을 뒤로 한 채, 포아의 발자취는 이제 프라움악기박물관으로 향합니다.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이 곳은 마치, 음악가들의 별장이라 해야 할까요. 대저택 같은 건물에 들어서면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다감하고 섬세한 인상의 장식품, 큰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아득한 지평선이 낯선 이의 발길을 맞이합니다. 바로 여기서 포아는 두 번째, 해설 있는 브런치 콘서트로 대중들과 친밀하게 호흡했습니다.
사실 해설 있는 음악회는 리사이틀의 기원을 떠올리면 그리 새로운 개념도 아닙니다. 원래 ‘recital’이라는 명사는 ‘낭송하다’라는 뜻의 동사 ‘recite’에서 파생되었을 뿐더러, 리사이틀의 창시자 프란츠 리스트는 연주 사이에 청중과 자연스레 얘기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죠. 포아가 이 날 기획한 주제는 바로 ‘프로그램 뮤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뮤직은 미술과 문학 등 타 장르 간 경계를 뛰어넘어, 음악의 추상성에 사실성과 구체성을 덧입힌 장르입니다. 첫 세 스테이지는 드뷔시 작품으로 연이어졌습니다. 노유리의 <판화>, 권민세의 <서풍이 본 것>과 <퓌크의 춤>, 김하늘의 <히드가 무성한 황무지>와 <불꽃>까지 한 호흡으로 내달으며 관객들은 세련된 프렌치 감각으로 고취되었습니다. 이 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려 유리창에 성에가 서렸는데, 드뷔시의 Impressionism은 창 밖 풍경과 어우러져 오묘한 여운을 빚어냈습니다. 이어 네 번째 스테이지는 프로그램 뮤직의 대명사(代名詞),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아의 대들보 김유상 회장님의 <키예프의 대문>은 어느덧 브런치 콘서트를 절정으로 이끌며 듣는 이의 마음에 묵직하고 강렬한 환희를 선사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최현호가 연주한 바르톡의 <야외에서>로 꾸며졌는데, 이 날 연주자는 응급실에 다녀오면서까지 20세기 난곡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스테이지 문이 열리며 환한 미소로 등장하던 연주자의 미소가 선연히 떠오르네요.
프로그램 뮤직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수준 높은 연주, 그리고 여러 사진과 해설로 풀어낸 포아만의 엣지있는 음악회는 관객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프라움박물관에서의 연주는 대중과 호흡한 소중한 추억으로 포아의 마음 한 켠에 고이 남았습니다.
포아 피아노 연구회 총무 신민정 (학 02)